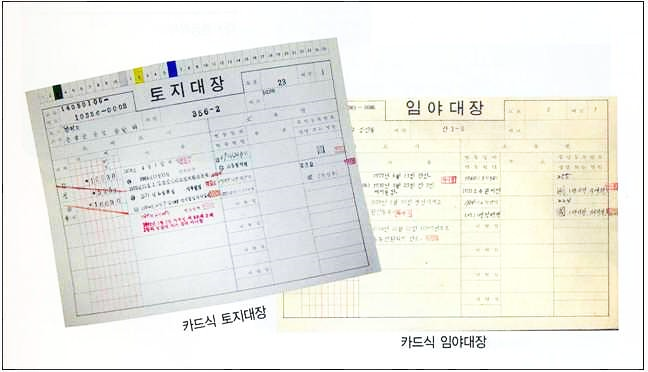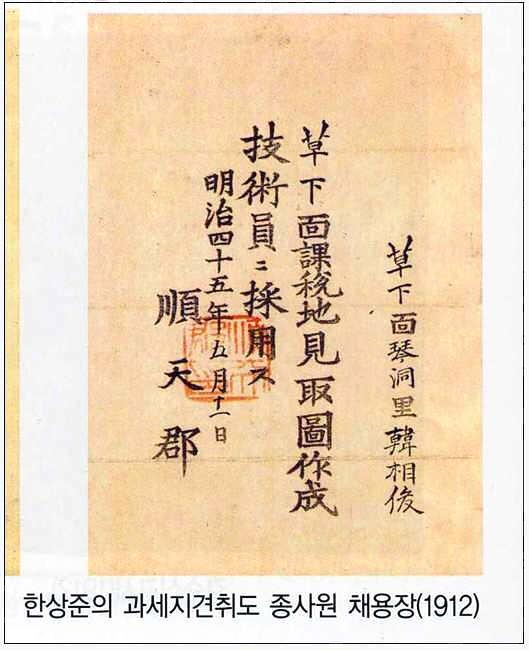옛부터 호구(戶口)의 조사는 국력의 측정면에서 중요하게 여겼다. 호구는 국가의 인력동원이나, 조세수입이나, 인구이동이나, 국가시책의 수행면에서 중요한 국력의 원천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조선왕조도 호적조사(戶籍調査)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註1] 규정하고 있다. 즉 호적은 매 3년마다 고쳐 만들어 호조(戶曹)와 한성부(漢城府) 그리고 도(道)와 그 고을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이나 지방에는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통에는 통주(統主)를 두었다. 지방은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매 면(面)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이 경우 지역이 넓고 호수가 많으면 재량(裁量)토록 하였으며 서울은 매 1방(坊)마다 관령(管領)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수교집록(受敎輯錄)』을 보면 [註2] 호적작성에 있어서 많은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한성부의 호적장부에 호적이 없으면 호조에 이첩하여 대조해서 분간하도록 명종 14년에 명령이 내리고 있다. 현종 때에는 호적에 기입되지 않고 충의(忠義)에 거짓으로 기록된 자는 모두 군역(軍役)에 충당시키고 여자로서 호적에 누락되었거나 나이 70세로서 호적에 누락되고 그 아들이 입적(入籍)된 경우는 다만 그 자신만을 수속(收贖)하고 그 아들은 정배(定配)치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호적에 누락된 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특별히 면죄할 뿐만 아니라 과거응시도 허용하였다.
이같은 규정은 숙종 때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겼다. 사인(私人)의 노비(奴婢)로서 그 주인을 배반하기 위하여 호적 중에 타인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하거나 생존한 아버지를 사망한 것처럼 입록(入錄)한 경우나 또는 서자손(庶子孫)의 명칭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적모(嫡母)와 외조모를 타인의 비(婢)라고 입록할 경우에는 강상죄(綱常罪)의 누범(累犯)으로 규정하고 정리(情理)의 과중자는 전가족을 변지(邊地)에 이거(移居)시켰다. 또한 그 아버지를 서삼촌(庶三村)이라고 하거나 그 어머니를 삼촌숙처(三寸叔妻)라고 하거나 그 숙부모를 자기의 친부모라고 하면서 노비를 점령하려던 쟁송자(爭訟者)는 사족(士族) 여부를 막론하고 변지에 이거시켰다. 연령을 증감한 것도 1년이면 자신과 가장(家長)을 각각 장(杖)100, 3년 이상이면 장 100과 도(徒) 3년에 처하고, 5년 이상이면 군에 충정(充定)케 하였다. 연령을 증감한 것이 6년 이상이면 관령(管領) 통수(統首) 이정(里正) 감고(監考)에게 장형(杖刑) 60 도형(徒刑) l년에 처하고, 점차로 형등급(刑等級)을 가하여 10년 이상이면 군에 충정케 하였다. 장정(壯丁)을 호적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가장을 벌하되 1인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2인이면 군에 충정하고, 3구(口) 이상이면 전가족을 변지에 이거시키고, 관령 · 통수 · 이정 · 감고에 대하여 장정 누락자가 1인이면 장형 80, 3인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5인 이상이면 군에 충당시켰다. 향소(鄕所), 감관(監官), 읍리(邑吏)로서 장정 누락자가 5인 이상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부관(部官) 수령(守令)으로서 장정 누락자가 10인 이상이면 파직시켰던 것이다.
호적작성에 있어서 호(戶)를 누락시킨 경우 호주는 물론이고 사대부(士大夫)나 공사천(公私賤) 할 것 없이 모두 군적사목(軍籍事目)에 의하여 변지에 이거시키고, 관령 · 통수 · 감고 · 이정에 대해서는 누락호(漏落戶)가 1호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누락호가 3호이면 장형 100을 가하여 군에 충당하고, 누락호가 5호 이상이면 전가족을 변지에 이거시키게 하였다. 향소 · 감관 · 읍리에 대해서는 누락호가 5호 이상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70호 이상이면 장형 100을 가하여 군에 충정시켰다. 부관 수령에 대해서는 누락호가 5호 이상이면 파직시키고, 10호 이상이면 파직시킨 후 영구히 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호적에 누락자는 사족(士族)과 상한(常漢)을 막론하고 전가족을 변지에 이사시키고, 뇌물을 받았거나 사실을 안 자는 중형(重刑)으로 처단한다. 뿐 아니라 호적을 취소하거나 누락된 것 같이 한 경우에는 대소 범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하되 전가족도 누락죄에 따라 변지에 이거시키고 3년간 노역(勞役)시켰다.
입적(入籍)하는 경우를 보면 고례(古例)에 따라 호구의 기입증서를 작성하여 호주에게 교부하는데 호구를 발라서 가리거나 자획과 인문(印文)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도답육부인신율(盜踏六部印信律)로 처벌하였다. 사송(詞訟)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호구조사 후에 수리하되 입적되지 않은 자는 법률에 따라 과죄(科罪)하고 사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호적은 하였다고 하여도 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처벌하였다. 타인의 노비를 암록(暗錄)한 것이 발견된 때는 비리호송(非理好訟), 압량위천율(壓良爲賤律)로 처벌시켰다. 대소송사(大小訟事)에는 현재 호구를 사건 첫머리에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다.
장정 3인을 호적에서 누락시킨 가장과 호에서 누락된 주호(主戶)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통수(有司統首), 감고, 이정, 누락자 자신에 대하여 사족(士族)이면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에 충당시키고, 평민이면 조군(漕軍)과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공천(公賤)이면 엄형(嚴刑) 후 기한없이 서북지방의 먼 곳으로 유배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호적에서 누락된 호가 10호 내지 50호인 경우는 담당관리, 향소, 감관은 장형 100을 처하여 충군(充軍)하고, 부관과 수령은 파면시키되 영구히 임용치 않고, 50호 이상 누락시킨 경우는 부관과 수령은 체포하여 정배(定配)시키고 감관과 색리(色吏)는 3차 엄형하고 전가족을 변지에 이주시켰다. 호적에 5명 이상을 위증(僞增)시킨 경우에는 감관과 색리는 장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수령은 파면시키게 하였다. 10명 이상을 위증시킨 경우에는 장 100을 쳐서 충군하고, 수령은 파면시켰다. 그리고 호적작성하여 교부 후 직명(職名) 역명(役名)을 고친 자는 정기개록시(定期改錄時)를 기다려 소도(小刀)로 자획과 인문을 발라서 가린 후 개서(改書)하여 호적사목(戶籍事目)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註3]
이처럼 조선왕조 전시대를 통하여 호적의 정리는 상당히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성(漢城)의 호구변천(戶口變遷)
옛부터 수도의 호구조사는 실시되어 왔다. 조선왕조 건국 후 한양 천도와 함께 새로운 서울의 건설도 진행되었으며 호구조사도 이루어졌다. 조선 건국 후 호구조사는 태종 4년(1404)과 태종 6년(1406)으로 되어 있다. 이때 호구조사는 두가지 연대로 표기되어 있다. 하나는 여기서 보는 태종 4년때의 연대표기이고 또 하나는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보이는 태조 4년 때의 호구조사의 내용이다. 태조 때와 태종 때의 조사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태조 · 태종의 표기에 혼돈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호구내용도 경상도와 풍해도(風海道)의 두 곳에서 약간 차이를 보일 뿐이다. 즉 태조 · 태종 4년의 경우를 보면 경상도는 태조 4년의 것이 호(戶)가 1이 많을 뿐이고 풍해도는 태조 4년의 구(口)가 40이 많을 뿐이다. 그후 호구조사는 세종 5년(1423)에도 실시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위해 <표 : 조선 건국 초 호구조사표>에서 보면 태종 4년을 표준으로 볼 때 전국의 호수가 153,404이고 인구가 322,786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년 후인 태종 6년의 경우를 보면 호수가 180,246이고 인구가 370,365로서 태종 4년에 비해 호는 26,842 인구는 47,579가 증가하였다.[註15]
여기서 인구조사를 보면 태종 4년의 조사에서 한성부,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 그리고 경기도는 빠졌으며 태종 6년의 조사에서도 한성부와 개성유후사는 빠져 있다. 그러므로 한성부의 호구조사는 세종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전국의 호구조사가 정확한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 그 이유는 태종 때의 호구조사의 목적이 오늘날 말하는 인구센서스와는 다른 것이다. 태종 때의 호구조사의 목적은 역(役)을 담당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년(丁年) 남자를 조사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 조사된 호구는 실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에 있어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뿐이고, 호에 있어서도 1가호(家戶)를 1호로 계산하지 않고 외방(外方)의 전결(田結)이나 경중(京中)의 신분에 따라 1가호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호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든가, 또는 삼정(三丁)을 1호로 계산한 경우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확한 호구계산에는 차이가 큰 것이었다.[註16]
또한 <표 : 조선 건국 초 호구조사표> 의 총수가 다르다고 보아야 되는 경우를 보면 "경기좌우(京畿左右) · 양광(楊廣) · 경상(慶尙) · 전라(全羅) · 서해(西海) · 교주(交州) · 강릉(江陵) 등 8도의 마병(馬兵) 보병(步兵) 및 기선군(騎船軍)의 총수는 200,800여인과 자제(子弟) 및 향역리(鄕驛吏) 등 제유역자(諸有役者)는 100,500여인이다"[註17] 라고 한 것을 보면 8도의 마 · 보병, 기선군과 자제 및 향역리 등 제유역을 합하여 301,300여인이 된다. 이 수는 태종 4년의 수에 비하여 2만여가 적은 것이고, 태종 6년에 비해서는 7만여가 되는 것이다.[註18] 이로서 태종 4년, 6년의 인구 통계는 8도의 마보병과 기선군 그리고 자제 및 향역리 등 제유역자만을 통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이 태조 2년 이후 각각 2만여와 7만여의 증가를 보인 것인데 이 때의 기록들은 남자의 정년(丁年)만을 기록한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처럼 조선초기 전국의 호구는 정년남자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태종 때는 한성부의 호구조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세종 5년(1423)부터 비로소 한성부의 호구조사가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세종 5년부터 조사된 한성부의 호구를 그 뒤에 조사된 것과 합하여 호구의 증가내용을 보면 <표 : 서울의 호구증감표>와 같다. [註19]
<표 : 서울의 호구증감표>에서 호구를 보면 숙종 4년이 적어지고 경종 3년부터 영조 5년의 3회에 걸쳐 10년간이 지난 후에야 숙종 43년과 비교하여 호수는 증가되었으나 인구는 아직도 적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고종 원년에 이르기까지 영조 8년(1732)의 서울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인구가 20만명이 넘은 1732년, 정조 4년(1780)과 정조 7년(1783), 순조 7년(1807), 헌종 3년(1837), 철종 3년(1852), 고종 원년(1864)뿐이지만 그것도 영조 8년의 서울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는 감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증가일로로 나타나고 있어서 호수증가와 인구증가는 상반된다고나 할까, 증가양상이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고종 이후의 호구증가(戶口增加)
19세기 중엽으로 들어오면서 세도정치(世道政治)의 극성은 민란을 일으켰고, 특히 진주민란(晋州民亂)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살상, 그리고 동학(東學)의 창교(創敎)에 따른 정부의 탄압 등 일련의 커다란 사건들은 질병의 유행과 기근에 따른 유망민(流亡民)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있으므로 큰 역사적 사건과 꼭 결부시켜 말할 수는 없을 지 모르나 실제로 헌종 원년(1835)부터 철종 14년(1863)까지 28년간의 남녀인구의 증가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증감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경우 호구조사의 부실을 들 수도 있고 또 헌종 14년의 경우는 전후년에 비하여 약 배 정도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조사의 잘못으로 여겨지지만 그같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호구증가율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표 : 헌종 · 철종연간 호구표>과 같다.[註20]
이제 고종 즉위 후인 1864년부터 융희(隆熙) 3년인 1909년까지 서울의 인구증가상황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기간은 고종 3년(1866) 병인박해(丙寅迫害)부터 고종 19년(1882) 동학교도들의 삼례집회(參禮集會), 보은집회(報恩集會), 서울의 복합상소(伏閤上疏)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내정면(內政面)에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하여 제대로 호구조사 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고종 원년(1864)부터 융희 3년(1909)까지 호구통계를 전국적인 것과 한성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먼저 고종 원년(1864)부터 융희 3년(1909)까지 한성부의 오부(五部) 별로 호수와 인구수의 변동상을 일람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성부의 호구가 전국의 호구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조하는 뜻에서 전국의 호구는 통계수만을 표기하였는 바 그 내용은 <표 : 한성부 호구 연도별 증가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구조사는 식년식(式年式)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매년 각지방별로 호구조사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다만 통계 면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가는 확인할 바 없으나 인구변동상을 볼 때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매년 성실하게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구조사에서 보면 고종 16년(1879)의 기묘식년(己卯式年)에서 1,932,528호로서 호의 경우 최고를 기록하였다. 인구에 있어서는 고종 13년(1876)이 3,423,615명으로 가장 많은 수이며 전후연도의 수에 비하여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연도에 비하여 조사상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인구는 고종 19년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고종 13년에 비하여 243,561명이나 적은 6,413,8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종 19년(1882)에 와서는 가장 큰 사건인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있었을 뿐인데 도시민이 서울을 떠나 피난한데 기인한다고 할지 어쨌든 정치변동의 변수 속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 고종 원년(1864)에 이룩된 갑자식(甲子式) 경외호구(京外戶口)의 수를 보면 경상도가 제1위이고 인구밀도는 그 비율로 보아 호수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호구증가의 양상이 일정한 비율로만 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갑자식 경외호구의 일람표를 작성해 보면 <표 : 고종 원년 갑자식 경외호구>와 같다.[註22]
고종 원년(1864)부터 융희 3년(1909)까지의 한성부 호구 연도별 증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서울의 호수와 인구의 증감에 따른 내용을 호수변화와 인구증가의 내용을 그래프로 작성해 보면 <표 : 한성부 전체호수증가표>, <표 : 한성부 전체인구증가표>과 같다.
<표 : 한성부 전체호수증가표>, <표 : 한성부 전체인구증가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종 12년에 호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의 착오인 듯 하다. 그런데 서울의 호수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다가 1909년에 갑자기 증가하는 바 이것 역시 조사통계의 잘못이 아닌지 앞으로의 통계작성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인구를 보면 여자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결혼관계 등 사회면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지나 여기서는 통계만을 표시하여 둔다.
위에서 지금까지의 호구변동관계는 우리나라의 행정보고(行政報告)를 통해 작성된 것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후에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주권침해가 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아울러 호구를 비롯한 각 분야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호구조사도 재한외국인(在韓外國人)과 함께 조사되기 시작하였다.[註23] 그 결과 호구조사도 각 지역별로 되어 있다.
고종 이후는 여러 나라와의 근대적인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어 각국인이 우리나라의 개항장(開港場)과 서울 등 대도시에 와서 거류(居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동양의 다른 나라 사람은 물론, 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미국인, 러시아인, 영국인, 독일인, 이태리인 등 구미 각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류하게 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인이요, 그 다음은 청국인이며 그외의 각국인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호구수의 조사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 거류의 외국인에 대한 연도별 증가상황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고 1905년 이후의 통계에서 대체적인 것은 짐작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기로 하면,[註24] <표 : 한국인 인구 지방별>은 1907년도의 조사로서 서울을 비롯하여 인접지역의 군(郡)을 참고로 몇 개를 예시한 것이다.
다음에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인구비례와 비교하여 인구밀도를 보면 <표 : 한국현주호구>와 같다. [註25] 이때는 외국인의 거류도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인의 수는 침략세력의 배경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서울의 인구는 대구, 평양, 원산 등 큰 도시보다도 대단히 많은 수이고 외국인의 거주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많아졌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이 이미 국제도시로의 발전은 되고 있으나 근대 도시시설의 미비 속에서 침략국가의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표 : 한국현주호구> <표 : 한국내 지방별 호구표>에서 보면 1909년 말의 서울인구가 1,774,599명인데 1910년말 서울인구는 238,495명으로 1909년에 비하여 1,536,104명이나 적은 수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억지로 추측한다면 주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떠나 지방으로의 피난 · 이주의 경우를 들 수 있겠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통계작성상의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시 참고로 1910년에 조사된 한국인 출생, 사망, 결혼과 이혼 지방별표를 통해서 본 서울에서의 사정은 <표 : 한국인 출생 · 사망 · 결혼 · 이혼 지방별표>와 같다.[註27]
이제 끝으로 우리가 주권을 잃은 19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호수와 인구수를 지방별로 보고 또 한국내 외국인을 가장 많은 일본인과 기타 외국인으로 나누어서 일람표로 보면 <표 : 한국현주호구>와 같다. [註28]
이를 보면 1910년의 인구총계가 13,128,780명으로 1909년의 총계인 12,934,282명에 194,498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1910년의 통계를 우리 일성록(日省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조사된 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1909년의 우리 기록의 전국 총인구가 12,363,404명으로 나타나 있는 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09년 것과 비교하면 429,122명이 많은 셈이다. 같은 통계인데도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조사자의 잘못이나 전국인구수를 통계하는데 있어서 계산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두개의 통계표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정확한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1,200만의 큰 수는 대략 같아서 1910년의 우리 인구를 1,300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